앤 퍼거슨은 일반적인 인간 섹슈얼리티의 역사적 구성에 대한 사례 연구로 그녀 자신의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이용했다. 그녀는 그녀의 현재의 (그러므로 바뀔 수도 있음을 함의하는) 애정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것은 "첫째, 내가 10대였을 때 나로 하여금 처음으로 한 여성과 신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던 역사적, 사회적인 맥락이고, 둘째,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전적으로 이성애적인 성인 생활에서 다시 여성들로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오늘날의) 강력한 자기 확인적인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저항 문화의 존재"다. 앤 퍼거슨은 만일 자신이 좀 더 제한적인 성적 환경에서 또는 페미니즘 경향이 적었던 시대에 성장했더라면, 자신은 아마도 레즈비언 연인을 갖기를 소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결국 "한 사람의 성적 대상들은 현재 진행 중인 그 사람의 성별(젠더) 정체성이 그 사람의 또래들과 관련하여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고 앤 퍼거슨은 말했다. (앤 퍼거슨의 1983년 책에서 인용된 부분.)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122-123쪽)
아.. 처음에 읽을 때는 끄덕끄덕 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겹겹이 동그라미 별표 이런 것들을 내가 막 그리고 있었다. 한 사람의 섹슈얼리티는 그 사람이 관계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는 1983년 앤 퍼거슨의 말은 나중에 1991년에 '젠더 트러블'을 통해 표현되는 주디스 버틀러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지금의 나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은 앤 퍼거슨의 것처럼 '강력한 자기 확인적인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저항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맥락이다. 아, 물론... 여중, 여고를 나온 나로써는 어느 여학교든 머리 짧은 소위 '남자같은' 언니들이 한 명씩 있고, 발렌타인 데이에 수많은 여자 후배들에게 초콜렛을 받을 만큼 인기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나도 중학교 때 그런 언니 한 명을 마음으로 조금 좋아하기도 했으니. 비록 인기스타 연예인을 흠모하는 것 같은 마음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소위 그 머리 짧은 남자같은 언니 한 명을 좋아한 적이 있기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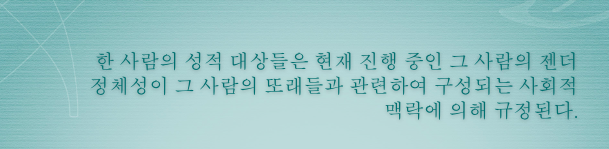
나도 만약에 저 위 앤 퍼거슨이 언급했던 사회적 맥락처럼, 여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것이 비정상 취급을 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오히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의 문화가 '저항' 문화의 상징, 긍정적인 방향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분위기, 페미니즘 경향이 지금처럼 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10대 혹은 20대를 보냈더라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인간을 좋아한다던지, 그에 앞서 어떤 인간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사실 그 인간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인간 자체로서의 그 사람의 매력 때문일 테니까. 나도 앤 퍼거슨과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성장했다면, 어쩌면 지금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하지만 나는 또 지금 두 아이의 엄마다. 만일 내가 레즈비언으로 산다면 지금의 나의 아이들이 없다는 이야기일텐데, 그건 또 맘에 들지 않는다. 물론 길고 긴 독박육아의 시간을 지나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그야말로 형편이 나아져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나는 시험을 망치고 와서 푸념하는 큰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계주대회 선수를 뽑기 위한 달리기를 하는데 갑자기 발목이 아파서 잘 달리지 못해 속상했던 둘째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모두 정말 즐겁다. 아 물론.. 엄마노릇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지만, 진부한 표현같아도 아이들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아 모르겠다.. 왜 꼭 양자택일은 여성의 몫인 걸까, 심지어 상상 속에서도. 레즈비언으로, 가부장적이지 않은 여자 파트너와 같이 살면서, 어딘가에서 입양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도 있겠지, 그 아이들이 나에게 정말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나지 않는다. 결국 내일의 시험공부를 하느라 평소 자는 시간을 훌쩍 넘겨서 자는 큰아이의 '알러뷰 굿나잇 사랑해' 하는 인사를 받고서야 끝이 났다.
어쨌든. 어느 동네에서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부럽다, 앤 퍼거슨. 당신 삶의 그 자유로운 사회적 맥락은 정말 부럽다. 그런데 저명한 미국의 페미니스트 철학자라는 이 분은 정말 어디가 고향인지 모르겠다. 구글도 모르나보다. ㅠㅠㅠㅠㅠ 지금 80대 할머니라는데, 도대체 그럼 근 7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동네는 어디인 걸까 계속 궁금하기만 하다.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 오늘의 구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장.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일부일처제의 허구성 - 엥겔스 (0) | 2019.10.21 |
|---|---|
| [2장. 급진주의 페미니즘] 완전히 평등한 세상에서라면? (0) | 2019.10.18 |
| [2장.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런 맛에 페미니즘을 읽는다! (0) | 2019.10.14 |
| [2장. 급진주의 페미니즘] 도발적인 논문, '질 오르가즘의 신화' (0) | 2019.10.11 |
| [2장. 급진주의 페미니즘] 내 뜻대로 하는 출산? (0) | 2019.10.09 |




댓글